1. 수능 / 리트 독해 연습지 - 리오타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28343
제 독해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뇌과학적 독해방법을 고수합니다. 독해는 단순히 글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구조화하고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배경지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경지식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사유할 수 있는 기반, 즉 생각의 뼈대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언어학의 구조주의를 보면, 언어는 ‘생성’을 위한 단계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고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사유하고 깊이 생각하기 위해선, 다양한 지식과 사고의 틀이 필요하다.” 저는 그 틀을 ‘배경지식’이라 부릅니다. 배경지식을 학습하고, 그 기반 위에서 아래와 같은 최고 난이도의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리오타르라는 철학자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가 왜 ‘이상한 인간’을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해요.
리오타르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사실 완성된 존재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린 보통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배워왔죠. 그런데 리오타르는 그 생각을 의심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 중심의 인간은 마치 틀 안에 갇혀 있는 존재야. 감정, 상상, 우연, 실패 같은 것들을 버리고, 계산과 규칙만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하거든.’ 그래서 그는 그런 인간을 비인간(inhuman)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여기서 ‘비인간’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리오타르가 말하는 ‘비인간’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 말이 리오타르 철학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그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다시 읽습니다. 칸트가 말했죠, “숭고란 감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예를 들어,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커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때 느껴지는 ‘벙찜’, ‘압도감’, ‘무력함’이 바로 숭고예요. 리오타르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는 말합니다. ‘철학은 이성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그 순간에서 시작된다.’ 즉, 생각이란 조화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충돌과 혼란 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이성이 멈출 때, 새로운 사유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리오타르는 철학을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증언’하는 행위로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모르는 상태를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려는 시도 그게 철학이고, 동시에 예술이에요.
그는 예술을 ‘부정적 현시(negative presentation)’라고 부르는데, 이건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음 자체를 보여주는 예술”을 뜻해요. 예를 들어,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신, 침묵과 공백으로 고통을 암시하는 그림이 그런 예술이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보여주지 않아도 보이는 것 그게 리오타르가 말한 예술이에요. 그가 자주 드는 예가 ‘홀로코스트’예요. 수백만 명이 죽었지만, 그 참혹함을 언어로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리오타르는 “아니”라고 답해요. 그는 이런 상황을 쟁론(différend)이라고 불렀어요. 말할 수 없는 사건,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럼에도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해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철학자의 역할이자 예술가의 사명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심화 독해 적용
이성은 자신의 자족적 질서 속에서 세계를 표상하려 하지만, 세계는 언제나 그 표상에 균열을 낸다. 이 균열은 단순한 인식의 한계가 아니라, 사유를 구성하는 조건 그 자체다. 언표 이전의 침묵, 개념 이전의 감각, 현시 이전의 부재는 이성의 언어가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생성한다. 예술은 그 사건의 증언으로서, 재현을 파기하며 비가시적 형식의 흔적을 남긴다. 숭고란 바로 그 흔적의 자리에 남은 사유의 상흔이며, 철학은 그 상흔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틈을 사유의 원천으로 열어두는 행위다.
위 지문을 한 문장씩 생각하면서 본인이 직접 "의미"를 생성합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4년생#05년생#07년생 인증O) 탈탈털린 짱르비 33 23
-
#공지#국어#독학생 9모 '두 출발' 떠 먹여드림 100 30
-
수능영어듣기 책 추천좀.. 0 0
평가원이랑 가장 잘맞고 배송 빠른 수능영어듣기책 없나요 ㅜㅜ? 제발루ㅜ루ㅜㅜ
-
얼버잠 2 0
잘자
-
10시간x10일=한과목당 한문제씩 더 맞출 시간 1 1
어림도 없지 바로 칼바람 ㅋㅋ
-
씹ㅏㄹ ㅈ같네 1 2
ㅈ반고 느그애미씨발년아개새끼들좆창
-
덮 화이팅 1 1
!
-
개추워 크레용 3 4
하 모기땜시 한숨도 못잠 그렇지만 but 모기를 도륙내는것에는 성공.
-
가채점표 왜 씀? 1 0
Omr하기 전에 시험지에 보기 편하라고 위쪽에 적은 것들만 쫘악 찢어서 꽁쳐두고...
-
담배피러가는데 0 0
ㄹㅇ 이제 겨울이다 개춥다
-
오늘 롱패입어도 되려나 0 0
경기돈ㅇ데
-
그냥 가채점표 안쓰고 6 0
3주동안 신나게 놀다가 안락사를 받아들여야겠다
-
수학 선택 짝홀 0 0
없어요??
-
잘잘잠 6 1
잘잘자고일어낫다는뜻
-
가채점표 굳이 필요함? 2 0
그냥 책상에다가 옮기고 집갈때 책상 들고가면 되는거 아님?
-
가채점표 질문 0 0
다들 가채점표 쓸 시간 되나요..? 작년엔 최저러였어서 영수만 챙겼었었는데 올해는...
-
롱패딩입을껄 0 1
개춥네
-
얼버기 4 0
학교가자마자조퇴할거야
-
개정이후 수학기출모음(2206~2609) 공통 미적분 20 19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개정이후 평가원 기출을 모아왔어요! 선택과목은 미적분만...
-
아 감기가 아니라 비염인가 0 0
발열 조금 몸살 x 코에 작열감 두통 약간 어중간하게 아프니까 더 힘드네
-
근데 적백이 3 0
원점수 100인거임 백분위 100인거임
-
츨발 고고혓 8 1
오우석 네 이놈
-
19패스가 11월 3일 종료라 그런건가 ㅋㅋ 대성 안산 사람들 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
예매 성공했ㅇ ㅓ..
-
서프 시계 달아주나여 ㅠㅠ 0 0
시계가 멈춰있지 왜…..
-
공통 말고 선택은 3 0
홀수형 짝수형 선지배치 똑같나요?
-
메인에 싸이버거 깊콘 뿌리는 식으로 하면 호감작 쌉가능임? 멘트나 선물 ㅊㅊ점
-
생명 1일 2실모 어떤가요? 0 0
생1 한번 푸는데 30분밖에 안걸리니까 괜찮을거 같은데 어떨까요?
-
등원 5 0
-
-2도네 오늘뭐입지 1 0
-
고등학교 교사들 솔직히 6 3
1년에 두세번씩 모의고사 보게해서 일정점수 미달나면 해고시켜야댐 그래야 공교육도...
-
오늘 날이 추운가 0 0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건조st라면 아악
-
ㅋㅋ
-
7시간 잤는데 깨자마자 두통이 2 0
이게뭐노싯팔
-
10일의 기적 2 0
해내야겠지
-
독서실 난방좀틀어줘라 5 0
추워서 어제오늘 설사를 몇번했는지 모르겠네 장사도 잘되면서 난방은 왤케 인색한거...
-
. 2 0
.
-
분당 cs 9.9개 2 0
ㄲㅂ
-
편의점 간다 2 0
ㄱㄱ
-
오늘 왤캐 추워 0 0
실모로 열 올려야지
-
아가 잘거야 4 1
잘잘잘잘거야!
-
개추버 5 1
-
기온 실화냐 10 1
이게 뭐노..
-
모기 못잡겠어 2 0
아가 슬퍼 ㅠㅠ
-
걍잠 4 0
응
-
저 ’얽매임‘이라는게 도가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다는게...
-
오 이거 재밌겠다 1 0
https://www.instagram.com/reel/DQjRszaEsRl/?igs...
-
버디버디 승률 왜케 높지 2 0
무엇
-
매교시 노트에 옮겨적고 지워야돼요?
-
란 한 판 해야겟다 1 0
5초의 사나이
-
적백 맞으려면 0 0
겨울때부터 문풀 양치기하면서 첨예하게 갈고 닦아야 하는거같네요.
-
솔랭 좀 해야지 4 1
등반 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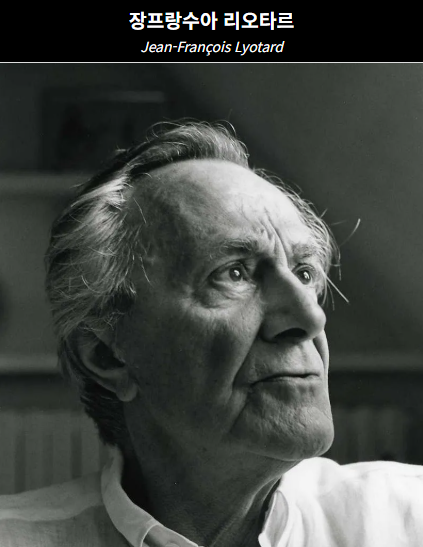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